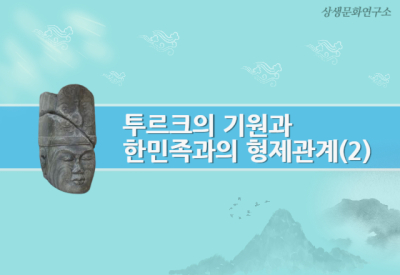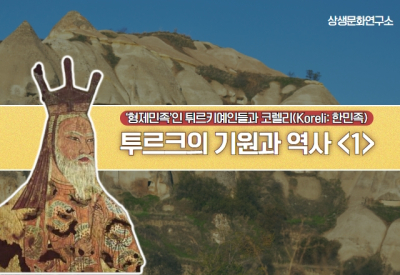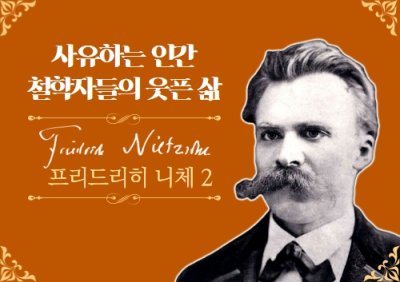- 전체
- 영성문화 산책
- 한국의 역사문화
- 지구촌 보편문화
- 제5차 산업혁명
- 연구소 칼럼
- 기타
에소테릭 하이데거?!(2) - 이성이 발언하면 사유는 침묵한다
에소테릭(esoteric) 하이데거?! 2
이성이 발언하면 사유는 침묵한다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연구위원
2) 존재는 비-근거(Ab-grund)인 심연深淵(Abgrund)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관계 맺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서 가장 먼저 알려지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우선 있고 나서 무엇, 무엇이며 어떻게… 등등이다. 존재 덕분에 존재자는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존재는 존재자와 관련해서는 ‘존재하게 함’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은 언제나 ‘존재의 존재자’이다.
그러나 존재는 존재자 넘어 혹은 그 배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에 속한다. 존재가 존재자의 질서와 다른 곳에서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재자일 따름이다.
존재가 머무는 ‘유일한’ 토포스(자리; 場)는 존재자이다. 그런 의미로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이다. 즉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로 속하면서 “모든 존재자를 발원(ent-springen)하게”(Grundbegrife) 한다.
이해를 위한 한 방편으로 다소 거칠게 말하면, 여기서 존재와 존재자는 도가道家 사상에서 도道와 물物의 관계에 유비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순화에는 양자 사이 무엇이 같고 다른지 묻는 비판적 사고가 항상 담보돼야 할 것이다.

서구 전통 형이상학은 존재를 근거나 원인으로 이해한다. “형이상학은 근거 짓는 표상함의 방식으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사유한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은 그 시작에서부터 존재자의 존재를 근거로 보았다.”(Zur Sache des Denkens)
그런데 하이데거에서 존재는 모든 있는 것들을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하지만 근거는 아니다. ‘존재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는 아니다?’
‘근거’를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또 형이상학적 의미의 근거만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의 주장은 형식논리에 반反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관건은 오히려 존재가 마치 존재자인 양 그것의 근거, 다시 이 근거의 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얘기하지 않는 데 놓여 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은 무엇을 낳고 그 무엇은 또 다른 무엇이 낳고 … ’ 하며 계보를 따지는 방식의 사유로써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존재란 창조나 제작, 작용의 근거 등 형이상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모든 기대를 거절하는, 비근거(Ab-grund)인 심연深淵(Abgrund)이라고 한다.
한편 앞에서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에 속하고, 존재자는 존재 덕분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존재에 속한다고 했다. 그럼으로써 존재와 존재자는 서로에게 속하며 단일함, 동시성을 이룬다.
존재의 경우는 존재자가 없다면 달리 머물 곳이 없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는 하나는 다른 하나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같은 되먹임의 논리는 서구 사유의 논리로써 보면 ‘순환의 오류’이다. 근거란 시간과 능력에서 항상 결과에 앞서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이데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에소테릭한 소리로 들린다.
반면 서구 형이상학과 달리
호체호용互體互用
[서로 번갈아 본체가 되고 작용이 된다]
불상리 불상잡不相離不相雜
[서로 떨어지지도 않지만 섞이는 것도 아니다.]
불일불이不一不二
[하나가 아니면서 둘도 아니다.] 등의
‘비서구적’, ‘비논리적’ 사유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하이데거 얘기는 그렇게 생경하게 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면 모든 상이한 것들의 조화가 그렇듯이 하이데거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함께 속함은 동일한 중심을 전제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둘의 ‘사이’며 둘을 하나로 묶는 ‘와(과)’가 될 것이다. 이 함께 속함의 중심은 차이 나는 둘, 즉 존재와 존재자보다 시원적이다.
역시 형식논리로 보면 비이성적 주장으로 들린다. 여기에 하이데거는 그 동일한 것은 함께 속함이 일어나는 ‘동안’이며 ‘폭’[場]이라고, 즉 때이자 곳[시공간]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에소테릭은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3) 존재와 인간의 공속성 사이 되먹임의 관계
존재와 하나의 특출한 존재자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관계 또한 당연히 공속성의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에 속하는데, 인간이 없으면 존재는 없고, 따라서 존재와 존재자의 함께 속함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인간[현존재]이 있는 한 존재는 ‘있다’.” 그러나 ‘에소테릭’하게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존재가 ‘있는’ 한 현존재가 있다.”는 말도 옳다.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모두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역시 되먹임의 논리에 속한다. 그러한 논리란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하이데거의 주장을 비합리적이고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존재와 인간의 공속성과 그런 의미에서의 동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둘의 ‘중심’은 앞서 말하듯 ‘사이’ 영역으로서 시공간이다. 하이데거에게 시간과 공간은 구별되는, 두 가지의 것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독일어 'zwischen'(사이)나 우리 말 ‘사이’나 ‘중’, ‘가운데’ 등 분명 시간과 공간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쓰였을 단어들은 시공時空에 대한 시원적 이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옛말들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 둘 모두에 적용된다. 물론 여기서 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듯, ‘지금’의 연속이 아니며, 공간 역시 뉴턴식의 'space-container'가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에소테릭한 얘기를 더욱 에소테릭하게 얘기하면, 하이데거에서 이 ‘때/곳’은 유일무이한 심연이고 둥근 원이고 놀이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고 죽는 곳이다.

4) 산과 골짜기와 같은 유有와 무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하이데거는 사유의 길에서 궁극적 목적이나 존재 근거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다. 위에서 시사되듯, 그에게 존재는 근거가 아니고 신神은 더욱 아니다.
존재는 도대체 존재자가 아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님’(das Nicht-Seidende)으로서 무와 같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말하는 무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무는 하나의 대상도 하나의 존재자도 아니다. … 무는 존재자에 대한 반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존재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Wegmarken);
사유가 존재를 사유하기 때문에 사유는 무를 사유한다.”;
존재자의 타자로서의 무는 존재의 면사포(Schleier des Seins)이다.”(Wegmarken);
존재와 무는 서로 나란히 병렬적으로 생기하지 않는다. 하나의 친족 관계 속에서 일방은 타방으로 향하고 있다. … 무가 존재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만큼 존재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Wegmarken).
이러한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뒤에 나올 해명들이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도 여기서 다음의 사실만큼은 비교적 확고하게 파악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무를 함께 속하는 것으로 또는 등가적等價的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나아가 둘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노자의 말을 상기시킨다.
“유무상생有無相生”;
“천하 만물은 유로부터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온다[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그래서 하이데거가 당시 이미 독일어로 번역된 도가道家나 선불교禪佛敎의 텍스트를 읽고 관련 구절에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이데거가 유와 무를 공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이는 그의 존재를 유무의 뒤섞임, 이를테면 ‘유야무야’한 것이라고 밝히는 셈이다. 이 또한 형식 논리에 위배된다. 있거나 없거나 양단兩端만을 인정하는 배중률排中律을 따르는 사유와 논리에게 유무공속을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에소테릭’하다.
서구 형이상학의 로고스적 성격을 규정하는 서구 언어의 입장에서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굳이 표현하자면 “있는 듯 있지 않은 있는 것 같은 ‘Some'”이란 규정이 그마나 존재 사태에 유효한 기술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다음의 사실도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하이데거에서 ‘에소테릭’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서는 시원적인 것, 즉 주관과 객관, 유와 무,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보다 앞서면서 둘 모두를 함께 속하게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할 것이란 점이다.
이 시원의 것은 무엇인가 혹은 어디인가? 보다 친숙한 노자의 말로써 물어보자.
유무의 “동일성을 현玄이라 한다[同謂之玄].”
노자에서 유무의 동일성을 담보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 심연 혹은 신비한 골짜기[玄]는 어디인가? 다음 논의에서 그 ‘무엇’ 혹은 ‘어디’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계속)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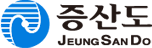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