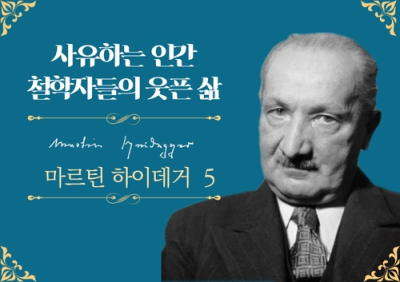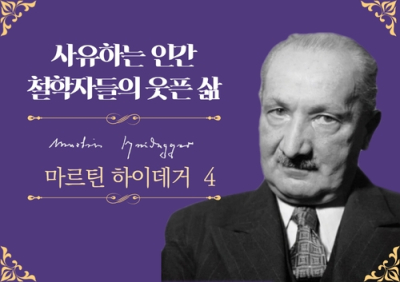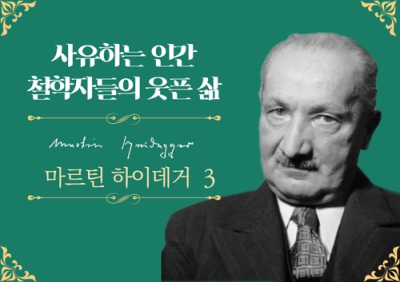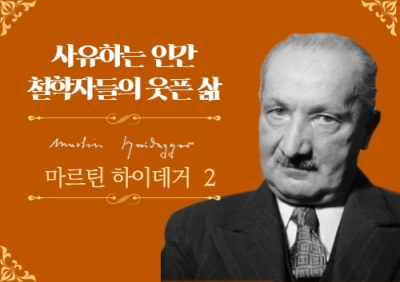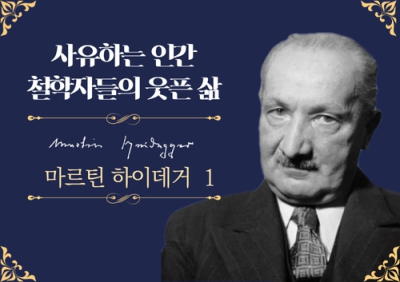- 전체
- 영성문화 산책
- 한국의 역사문화
- 지구촌 보편문화
- 제5차 산업혁명
- 연구소 칼럼
- 기타
나는 그 고요함을 사랑하노라 (2)
나는 그 고요함을 사랑하노라[我愛其靜]
- 2. 고요한 두 산山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하이데거가 그의 주요한 사유의 길목에서 거론하는 고요함(Ruhe)은 어떤 사태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서 자유와 안식이, 부드러운 기쁨이, 또 청량함이 솟아 나오는가. 산山에 관한, 두 개의 시 구절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기로 하자. 하나는 하이데거가 인용한 것으로서 괴테의 시구에 나오는 산이며 다른 하나는 도연명의 음주飮酒 오수五首 속 남산南山이다.
“모든 산봉우리 위에/ 고요함이 있다(Über allen Gilfeln/ Ist Ruh).”
(Grundbergriffe)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일메나우에 위치한 키켈한산山의 한 산장山莊 창문설주에 써놓은 시구다. 하이데거는 여기서 ‘ist’(‘있다’, ‘이다’란 뜻을 지닌 동사 ‘sein'의 3인칭 단수 현재형)’에 주목한다. 통상 ‘ist’가 쓰이는 문장에서, ‘ist’는 그 자체로는 무규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때그때 걸려 있는 존재자들로부터 의미를 길어내기 마련이다.
예컨대 ‘저 산봉우리 위에 송전탑이 있다’고 할 때, 이 ‘있음’은 ‘저 산’, ‘위에’, ‘송전탑’이란 표상된 존재자들로부터 의미가 규정된다. 저 산 위의 송전탑이 대상화되고, 이때 ‘ist’는 그것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진 괴테의 저 시구에서, ‘ist’는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해명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이때 ‘Ruh(고요함)’를 송전탑과 같은 표상될 수 있는 존재자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요함이 송전탑이나 전망대와 같은 방식으로 저 산 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있다는 말인가? ‘고요함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있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이데거는 이 ‘있음’에서 “불러 모여진 풍부함의 유일무이함(das Einzige eines gesammelten Reichtums)”(Grundbergriffe)이 말해지고 있다고 한다. ‘불러 모음’, ‘불러 모여 있음’은 존재에 관한 그의 기술記述에서 자주 접하는 중요한 용어에 속한다.
존재가 은닉과 숨김으로부터 자신을 열어 밝히며 그 밝게 트임의 장場에, 그것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로 감싸 존재하게 하는, 또 그렇게 존재하는 사태를 말한다. 존재는 자신을 환히 밝히며, 혹은 그 열어 밝힘에서 자신을 내주며 영역화領域化하는 것이다.
그리고 ‘풍부하다(reich)’는 본래 ‘허락해줄 수 있다’, ‘내줄 수 있다’, ‘이르고 도달하게 할 수 있다’란 뜻이다.(Unterwegs zur Sprache) 인용구에서의 ‘풍부함’은 존재가 존재자를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수락함을 가리킨다. 그와 같이 존재의 충만된 밝음의 장에 존재자가 간수돼 그 자체로서 들어서는 일은 다른 것과 비교,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밖에도 우리들 자신인 인간이 저 존재의 발현으로 향하는 응대의 본래적 성격을 끊임없이 마음을 불러 모아 그리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존재와 인간 양편에서 모두 상대를 향해 자신을 불러 모아 그리로 내맡김을 보는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존재에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불러 모음의 의미에 따라 ‘[모든 산봉우리 위에] 고요함이 있다’에서 말해지는 ‘불러 모여진 풍부함’이란 존재가 밝게 트이는 비은폐非隱蔽에서 산봉우리가 그 자체로서 머묾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

“모든 존재자에게서 처음으로 그리고 도처에서 현성現成하는” 그 비은폐에서 존재자는 그 때마다 자기 존재의 “본질유형을” 선사받는다.(Grundbergriffe) 존재의 밝게 트임에서 모든 산봉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자체로서 현존하도록 허락되며 고요히 머문다.
즉 “그 자체로부터 순수한 나타남과 내보임의 고요함으로”(Parmenides) 들어선다.[‘현성現成(性)하다’는 ‘본래적으로 머물다’와 함께, 하이데거가 자주 사용하는 'wesen'을 번역한 표현이다. ‘현성하다’는 불가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사실이 현재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지금 있는 그대로이다.’(『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한다. 'wesen'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현성하다’를 택한 것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매우 적절한 차용이라 생각된다.]
탈은폐脫隱蔽에서 밖으로 솟아나 그 자체로 고요히 머무는 산봉우리의 존재는 근거나 원인을 밝혀 파악하거나 이론적, 실용적, 심미적 관점 등에서 이러저러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은 산이다.’ 산은 건강을 위해 있는 것도 정상을 등정하는 쾌락을 위한 것도, 멋진 풍경으로 있는 것도, 유실수와 휴양지를 통해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산은 산이 아니다.’
인간의 이해와 욕망으로 덧씌워진 그 모든 비본래적 규정들을 여의고 나야 산은 존재의 밝음 속에 민낯 그대로의, 시원의 산으로서의 자신을 내보인다. 다시 ‘산은 산이다.’ 산은 자신에 대한 모든 해명을 거부하며, 그것 자체로서 우리 가까이 이르면서 우리를 관여하고 눈짓하며, 사로잡는다. 이때 산에 고요함이 걸려 있다.

모든 산봉우리 위에 생기하는 존재의 탈은폐, 그 정적靜寂의 매혹魅惑에 시인은 ‘모든 산봉우리 위에 고요함이 있다.’고 옮김으로써 응대하고 있다. 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산을 보자. 도연명의 음주 오수에 나오는 남산이다.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을 따다] 물끄러미 남산을 바라본다[悠然見南山].’
그러나 이 시구가 말하는 것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는 시 전문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 사는 곳에 띠집 지어 머물지만 수레와 말의 시끄러움이 없네. 묻노니 그대는 어찌하면 그럴 수 있는가. 마음 멀어지니 땅 절로 외지다오.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을 따다 물끄러미 남산을 바라보네.
해질 무렵 산 기운 아름답고 나는 새 함께 돌아온다네.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련만, 분별해 말하려 해도 이미 말을 잊었네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彩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시에 ‘고요함[靜]’과 ‘한가함[閑]’은 포함돼 있지 않아도 그것의 말없는 울림을 들을 수 있다.
남산이 등장하는 구절에서, 대개 ‘보다’로 새기는 ‘見’은 또한 ‘나타나다’, ‘드러나다’, ‘내보이다’란 뜻의 ‘현’으로 읽어야 한다고 한다. 시인이 국화를 따다 물끄러미[悠然] 남산을 ‘바라봄[見]’은 동시에 남산이 시인을 향해 ‘드러남[見]’이란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에 따르면 나타남, 빛남의 “시원적인 방식”(Parmenides)은 바라봄, 눈짓함, 응시이다. 이 경우 시인은 남산의 응시에 “바라보여진 것”(das Angeblckte)이다. 이제 ‘유연현남산’에서는 이중의 바라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시인을 향해 밝게 빛나며 스스로 내보이는 남산의 바라봄(Blicken)과 그 응시(Anblick)를 향한 시인의 바라봄(Erblicken)이 그것이다.
시인은 스스로를 내보이며 바라보는 산의 관여에 상응하여 그것을 향해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 경우 ‘시인이 남산을 보는가, 남산이 시인을 보는가?’라고 묻는 것은 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주객의 시비가 닿지 않는데, 다시 주객을 따지려는 무용한 시도에 대해서는 답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남산과 시인 사이 주고받는 서로를 향한 바라봄에서 시인은 남산을 남산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충만한 존재의 장場과 하나로 어울린다. 남산을 향한 탈자적脫自的 바라봄과 시인을 향해 눈짓하는 남산의 존재가 하나로 물드는 것이다.
남산을 향한 시인의 응대는 자신을 넘어 저 밝게 트이는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모으는, 불러 모으는 것이다. 동시에 남산에 대한 순수하지 않는 모든 관점을 버린, 정작 남산 그 자체와 무관한 일체의 견해들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남산을 향한 모든 외적 관점들은 그 바탕에서 보면 무엇을 모종의 셈법 아래 두는 계산적 사유와 관련돼 있다.
서구 형이상학을 주도하고 그것의 완결인 기술에서 극단에 이르는 그러한 사유방식은 결국 남산을 대상화하여 파악하고 그래서 장악하고, 나아가 이용하려는 의지와 욕망으로부터 추동되고 있다. 이 의지, 욕망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을 귀찮게 하고 나아가 인적, 물적 자원으로 드러나도록 집요하게 몰아세우는 인간중심적, 주체중심적인 모든 태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시인의 바라봄은 이와 같이 앞으로 마음을 모음이자 뒤로 물러섬으로써 이뤄진다. 시인은 사유거리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그것에 대한 일체의 본질 외적인 관점으로부터 물러서, ‘즉사즉진卽事卽眞’의 시선으로써 그것으로 하여금 그 자체로 존재하게 한다. 그 바라봄에서 비로소 남산은, 또한 만물은 그 자체로 들어서 고요히 머문다. “그 자체로부터 순수한 나타남과 내보임의 고요함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도옹陶翁[도연명]이 바라보되, ‘물끄러미’ 본다고 할 때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같은 사태일 것이다. 그것을 대상을 모종의 이해와 관심 속에 꼼꼼히 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전혀 ‘마음챙김(mindfulness)’이 없이 흘깃 보고 마는 것도 아니다.
‘물끄러미’ 바라봄은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 바라보이는 것이 이러저러한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게 현전하도록 개현開顯의 장소를 내주는 것이다. 또 그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함이 없이 존재 발현을 기다려 주는 것으로서 수행된다. 그러한 숙고적, 혹은 명상적인 시선만이 남산의 존재가 현성하도록 구호救護한다. 여기에 고요함이 지배하는(walten) 것이다.
존재는 자신을 열어 밝히며 인간의 바라봄을 향하고, 혹은 인간을 응시하고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리로 마음을 모아 맞아들이는 가운데 탈은폐와 고요함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결코 “운동의 결여”(Was heinßt Denken?)를 의미하지 않는다. 존재의 탈은폐는 은닉과 부재不在로부터 솟아나는 발현의 사건이다. 그것은 은닉과 부재의 장막을 열고 나오는, 또 은닉과의 투쟁을 감내하는 가운데 있는 동動이다.
더욱이 고요함은 그것을 통해, 그것 ‘때문에’ 비로소 존재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들어서기에 모든 동적인 가운데 가장 지극한 동이다. 그것은 “어떤 운동보다 동적이며 어떤 움직임보다 더 활기 있다.”(Unterwegs zur Sprache) 탈은폐의 머묾에서 고요함은 동중정動中靜 혹은 정중동靜中動의 그것인 셈이다.

하이데거는 한 중국인 동료(Paul Hsiao)와 『노자』 일부(1, 15, 18, 25, 32, 37, 40, 41장)를 공동 번역하는데, 그 가운데 15장의 일부 구절(孰能濁以靜之徐淸, 孰能安以久動之徐生)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옮긴다.
“누가 고요하게 될 수 있어서 고요함으로부터,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밝게 드러나도록 하는가?”;
“누가 고요하게 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가? 하늘의 도.”(Heidegger’s hidden source)
어느 쪽의 해석이든 고요함[靜]은 ‘밝게 드러나게 함’, ‘존재하게 함’과 함께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노자』에서는 이밖에도 16, 26, 37, 45, 55, 57, 62장 등의 다양한 문맥에서 고요함이 등장한다.
이로써 존재의 발현을 언어로 옮긴, 두 시구를 통해 고요함이란 존재가 환히 드러나고 그 밝게 트임의 장에서 존재자가 하나로 어울리며 고유하게 머무는 사태임을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존재가 자신을 열어 밝히는 탈은폐에 존재자가 감싸여 비로소 존재자로서 밝게 드러나 머묾, 즉 “밝게 트이며 빛남 속에 자신을 내보임, 그런 의미에서 나타남”(Was heißt Denken?)에 고요함이 ‘있다’.
“현존現存하는 것의 현존에서 불러 모음”(Was heißt Denken?)인 고요함은 존재가 비은폐로 현성하고 존재자가 그 밝음에서 비로소 그 자체로 들어서도록 모으는 것이면서 그렇게 모여 있음이다. 하이데거에게는 고요함이 지배하는 탈은폐의 머묾이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이유다. “가만히 바라보면 만물은 스스로 얻은 것 같다[萬物靜觀皆自得].”(「秋日偶成」) 가만히 바라봄에 자기 됨에 이른 사물, 예컨대 비로소 산이 된 산, 물이 된 물에 고요함이 깃든다.
글을 마치며, ‘정靜’을 다룬 노자의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제16장]를 불러내고자 한다.
“완전한 비움에 이르러 고요함을 굳게 지킨다. 만물이 어울려 일어날 때 나는 돌아감을 본다. 온갖 것 번성하나 각기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 한다.
그리고 고요함을 일러 주어진 제 본래성[命]을 되찾은 것이라 이르고 그 되찾음을 영원함이라 하며 영원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굳이 그 뜻을 요약하면 만물이 화동和同하여 제 근본으로 돌아감이 고요함이며 영원이고 밝음이라는 것이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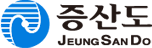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