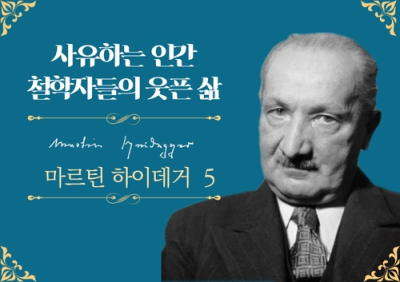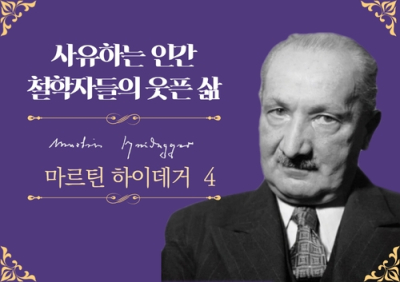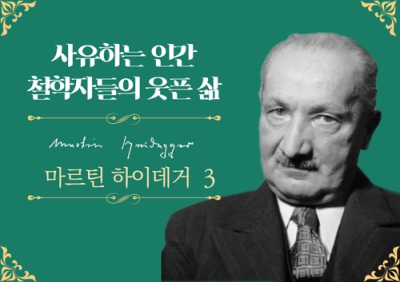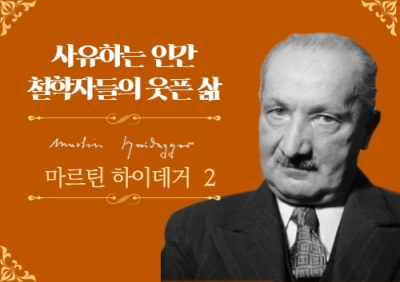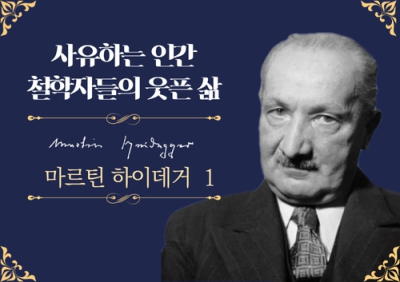- 전체
- 영성문화 산책
- 한국의 역사문화
- 지구촌 보편문화
- 제5차 산업혁명
- 연구소 칼럼
- 기타
존재는 둥글다(4) - 발현 혹은 심연
존재는 둥글다 (4)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연구위원
Ⅳ. 발현 혹은 심연
존재와 하나의 특출한 존재자인 인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관계 또한 공속성의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없으면 존재가 없고, 따라서 ‘둥근 원’이나 사방으로 트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함께 속함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에 속한다.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명될 수 있다. 존재의 본질이 비은폐란 규정은 존재란 언제나 은닉으로부터 밝게 드러남이란 점과 아울러 그 발현이 일어나 머무는 장, 말하자면 발현이 담길 ‘그릇’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존재는 비은폐로서 영역화하는 한, 개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은닉으로부터 발현하는 또는 은닉으로 “물러남으로써 우리를 매혹하는 것”(Was heißt Denken?)은 오직 개방된 여지가 허락될 때 열어 밝혀지고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존재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필요로 하는 개방성을 떠맡는 것은 사유하는 인간 혹은 인간의 사유이다.
인간의 본질은 사유를 통해 존재 진리의 장으로 쓰이는 데 있다.
“인간의 특출함은 그가 사유하는 본질로서 존재에 열려 있고, 존재 앞에 세워져 있으며, 존재에 관련된 채 머물면서 그렇게 존재에 상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인간은 본래 이 상응의 관련(Entsprechung)으로서 있으며, 다만 그것이다.”(Identität und Differenz)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로서의 사유가 왜 존재 진리가 현성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릇의 ‘미덕’은 텅 빔에 있다. 사유가 존재에 상응하려면, 다시 말해 존재로서의 존재가 체류할 개방성이 되려면 스스로를 비워 그로부터 그리로 존재 발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의 사유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수행되는가?
하이데거는 ‘마음’, ‘심정’, ‘진심’을 뜻하는 ‘Gedanc’란 독일어 고어古語의 의미로부터, 사유를 “기억”(Gedächtnis)과 “감사”(Dank)로서 설명한다. 이때 기억은 단순히 상기하고 보존하는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유의 본질을 이루는 기억이란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향해 있는 것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은 “[사유거리로] 마음을 불러 모으는 것”(Die Versammelung des Denkens)(Was heißt Denken?)이다. 그럼으로써 기억은 자기 바깥으로 향하며 붙잡는 바 사유거리를 우리 가까이 이르게[현존] 한다. 사유거리들은 이를 통해 간수되고 지켜진다.
예컨대 내가 마음을 오롯이 기울여 기억 속에 지키는 것은 내 옆을 지나가는 아무개보다 또 내 앞에 놓인 어떤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억으로서의 본래적 사유란 사유하는 바가 비로소 그 자체로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간수하여 지키는 마음챙김(Mindfulness)과 같은 것이다.

이때 마음을 불러 모아 간수하여 지킴이란 단지 능동적이거나 단지 수동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향해 마음을 씀과 물러나 그것을 받아들여 감내하는 지킴이 ‘~이자 또한 ~인’의 방식으로 서로 결속돼 하나를 이루고 있다. 물러나면서 사유거리로 마음을 쏟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러서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본래적 사유란 자기 밖으로[脫自] 앞으로 나아감이자 뒤로 물러섬, 정확히는 양자가 서로 속하는 합일의 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말해준다.
그와 같은 역동적, 원환적 성격의 맞이가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것만이 자신을 비워 사유거리가 현존하는 장을 내줄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물러서고 물러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개방성이 밝게 열리는 것이다. 본래적 사유는 그 개방된 여지에서, 또한 그것으로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인간은 영역화하는 존재 진리를 영접하는 마당으로서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 사유는 존재자의 존재를 대상화하여 어떤 무엇임으로 이러저러하게 규정하는 방식의 사유와 무관하다. 존재가 그 자체, 즉 비은폐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표상적인 방식의 사유를 포기해야 한다.
표상함은 인간이 스스로를 세계의 주체나 중심으로 여기면서,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붙잡아 이론적,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존재자를 이성적으로 자신의 고려 안에 두는 계산적 사유이다. 계산적 사유가 꼭 수數와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계산적 사유는 계산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보다 유망하고 경제적인 가능성들을 계산한다. 계산적 사유는 하나의 전망에서 다음 전망으로 분주히 뛰어다닌다. 계산적 사유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마음이 모여져 있지 않다.”(「Heidegger, Yoga and Indian Thought」)
근세에 이르러 더욱 노골화된, 표상적이며 계산적인 사유 방식의 밑바탕에는 모든 것을 파악 가능하고, 장악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권력 의지가 숨어 있다.
“계산적 사유는 무엇보다 의지의 사유며 모든 것의 계산된 조작에 겨냥돼 있다.”
(「Heidegger, Yoga and Indian Thought」)

존재에 올바로 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현존하는 것들을 무제약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지배 의욕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의욕하지 않음(Nicht-Wollen)을 의욕해야 한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인간 본질의 연관인 사유는 표상적 대상화의 사유에 비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다. 하이데거는 Gelassenheit(『내맡김』)에서 앞으로 나아감의 개방성과 뒤로 물러섬의 수용성으로써 수행되는 존재 사유를 ‘내맡김’(Gelassenheit)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진리인 “사역에 적합한 [인간의] 관련”, 다시 말해 사역에 대한 “상응”을 우리 가까이 영역화하는 사역을 향해 자신을 ‘내맡김’으로서 규정한다. 그는 또 대상을 언제나 모종의 셈법 아래 넣어 놓으면서 의지의 무제약적 확장을 기도하는 일체의 ‘형이상학적’ 유위有爲를 포기하는, 그로부터 물러서는 ‘내맡김을 “기다림”과 같은 것으로 말한다.
과학자, 학자, 스승 세 사람이 들길을 산책하며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기술된 「내맡김의 토의」(이상 Gelassenheit)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있는가? 과학자와 학자는 의문을 갖는다. 여기에 스승은 말한다. 우리는 기다림 외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하이데거에서 내맡김의 기다림이란 존재를 위해 자신을 버리며 마냥 수동적인 상태로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존재 진리인 사역의 개방된 여지로 들어서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맡김은 우리를 향해 펼쳐지는 것을 향해 마음을 모아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뒤로 물러남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내맡김은 그러한 방식으로 개방된 자리를 열어 영역화의 이행인 사역의 존재가 그리로부터 그리로 현성하게 한다. 모든 것들은 사역의 존재 발현에서, 그것을 ‘터전’으로 비로소 존재자로서 있게 된다. 그러기에 사역의 영역은 사물들이 표상의 대상으로서 우리 앞에 마주 서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윽고 저의 본성과 기원에 머무는 개방된 장이다. 그 점에서 사역을 향한 내맡김의 ‘무위’는 또한 최상의 ‘유위’이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존재와 인간은 함께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존재를 향해 사유로써 자신을 바치고 존재는 그 사유의 개방성에서 자신을 열어 밝히며 내준다. 존재와 인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속한다. 나아가 이 둘은 동일하다.
이때의 동일성은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부터 그리로”(Identität und Differenz) 함께 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존재 진리의 영역이자 사유의 개방성으로서 존재와 인간 사이의 ‘사이’며 중심을 가리킨다. 그곳은 “존재와 사유가 서로를 제 것으로 삼으면서 함께 속하고 그것들의 본질적 관계에 이르는 균형 잡힌 영역이다.”(Identität und Differenz)
이러한 동일성 개념은 일찍이 파르메니데스가 그의 『단편들』에서 마치 ‘화두話頭’와 같이 내건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이기도 하다.

존재와 인간은 이러한 함께 속함에서 각자의 본질에 이른다. 존재는 인간의 사유에서 자신의 참됨인 비은폐로서 머문다. 동시에 인간은 그렇게 존재 발현의 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존재를 지키는 목자’, ‘존재의 가까움에 거주하는 이웃’이라는 자기 고유함에 이른다.
존재에 대한 ‘다만 상응의 관련’일 따름인 그의 본질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 진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일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선다. 인간의 본성인 사유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존재 진리는 본질로서의 인간,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살고 죽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인간을 향한 존재의 요구는 인간에게는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본질을 최고도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존재 진리의 장으로서 바치는 기억의 사유는 동시에 자신의 본질 유래에 머물도록 한 호의와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다.
여기서의 ‘본질에 이르게 함’ 역시 형이상학적 혹은 과학적 의미에서의 근거지음과 무관하다. 존재와 인간이 이윽고 참됨으로 있는 곳은 존재와 인간보다 시간에서 선행하고 능력에서 우월한 근거가 아니다. 존재 발현의 영역은 근거를 거부하는 비근거(Ab-grund)로서 심연(Abgrund)이다.
발현이 지배하는 저 사이 영역은 스스로 밝게 트이는 ‘폭’[사이]인 동시에 그 영역화가 견지되는 ‘동안’[사이], 즉 시공간 또는 ‘시간-놀이-공간’이다. 시간과 공간 사이의 ‘놀이’는 시공간을 열어 존재와 존재자, 존재와 인간의 단일함 또는 둘의 균형을 붙잡으면서 존재의 진리를 나르는 일을 말할 것이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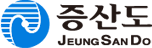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