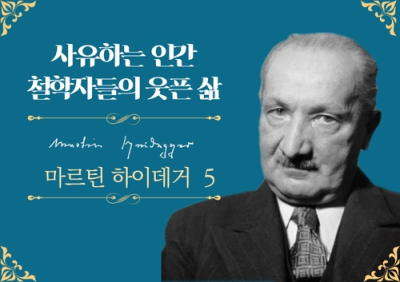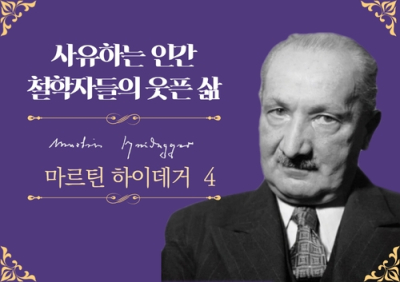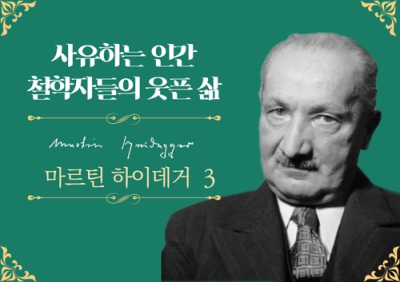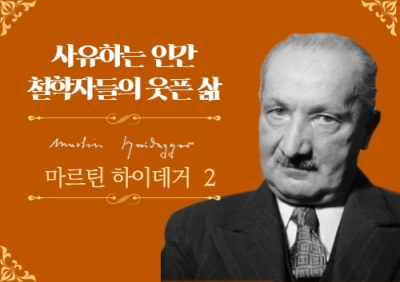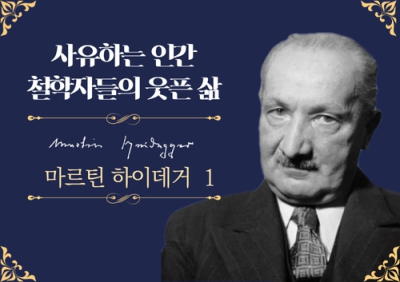- 전체
- 영성문화 산책
- 한국의 역사문화
- 지구촌 보편문화
- 제5차 산업혁명
- 연구소 칼럼
- 기타
하나의 별을 향해 가는 것, 오직 그것뿐! - 마르틴 하이데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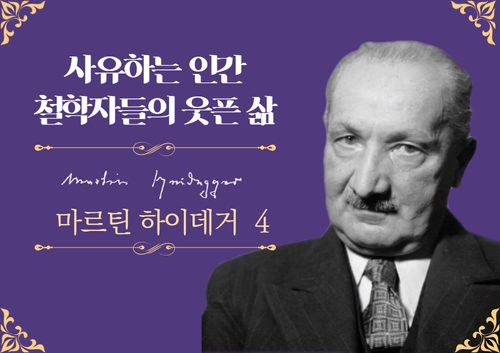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4️⃣ 인간만이 실존한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얻기 위해 하이데거는 인간 본질 안에 있는 이 밀실을 열어젖힌다. 하이데거는 물론 치밀하게 구성된 “실존-분석” 안에서 이같은 작업을 한다.
철학자는 “실존”을 현실적으로 있음[저 나무는 실재한다(existiert), 눈앞에 존재한다(ist vorhanden)]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이데거에게 실존은 오히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명칭이다. 동물과 식물은 실존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실존한다. 무슨 이유로 그렇다는 것일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재함에 있어서 이 존재를 문제 삼는” 유일한 존재자이다.
나는 내게 문제가 되는 사물들을 배려하거나 목적들을 추구함으로써 실존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행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에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나 본질에서 하나의 이행해야 할 과제를 본다.
나아가 그는 실존이 충만된 존재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실존론적 범주(Existenzialien)”라고 호명한다.
여기에는
✔내던져져 있음(Geworfenheit)
✔기획투사(Entwurf)
✔불안
✔염려
✔양심
✔책임이 있음
✔죽음 등과 같은 개념들이 속한다.
이런 개념들의 배후에 인간 실존의 위력이 숨어 있다. 그리고 마르틴 하이데거는 바로 그 힘을 탐구한다.
그렇지만 그의 분석은 사르트르가 수행한 것과 같은 실존 논의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프랑스 실존철학자는 이를테면 인간에 직접 관여하며 인간에 대해 발전시킨 표상들로부터 인간의, 인간을 위한 한 이론, 예컨대 자유의 이론을 끌어낸다.
그에 비해 형이상학자 하이데거에게는 인간 실존이란 우선은 (시간적으로 사유된) 존재의 의미에 다다르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다. 존재의 의미가 밝혀질 때, 비로소 인간 실존은 새롭게 규정되며 변화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이데거는 결코 전통적인 실존 철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분석들을 통해 현대 실존철학의 동인動因을 제공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곧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 현존재의 존재구조들 - “실존론적 범주들”을 다루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존재구조들 중 하나인 염려(Sorge)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시간의 가장 내적인 본질”에 대해 기술한다.
당연히 여기서 염려란 집세를 지불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염려란 개념을 실존인 인간이 이행해야 할 과제로 이해한다. 염려에는 그가 “기획투사(Entwurf)”라고 부르는 것이 속해 있다.
“기획투사”란 어떤 계획과 같은 게 아니다. 인간이 자기의 존재에서 실현시킬 실존-가능성들에로 자신을 기획 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염려에는 “내던져져 있음(Geworfenheit)”이 속해 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실존 가능성들에로 자신을 기획 투사할 수 있는 인간은 이미 늘 가능성들에 내던져져 있음을 말한다.
끝으로 염려에는 하이데거가 사물들(주변세계, Umweit)에 대한 인간의 “배려하는” 태도라고 부르는 것이 속해 있다. 이러한 “배려”는 주변세계와 교섭하는 (실천적인)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이론적인)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배려”에서 실존 가능성들을 실현한다.
이제 하이데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존 가능성들로 자신을 기획투사함은 시간의 근원적인 혹은 가장 내적인 본질에 속하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밝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존 가능성들로 내던져져 있음은 시간의 가장 내적인 본질에서 두 번째 계기를 이루는 기재(旣在, Gewesenheit) 즉 과거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의 배려는 근원적 시간의 세 번째 차원을 형성하는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고, 인간이 그로부터 시계상의 시간을 이끌어 내는 세 계기로 이뤄진 근원적 시간에서 존재의 의미를 구한다.

또 다른 본질적 실존론적 범주는 죽음이다.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인간 현존재는 실존하는 한, 현사실적으로 죽는다. 죽음이 그를 꿰뚫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죽음으로써 완료되지 않는다. 완료되지 않은 현존재가 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흔히 “비가 그쳤다”라고 말할 때와 같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존재는 “마지막 붓질과 함께 그림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죽음과 함께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현존재는 존재하는 동안 오히려 지속적으로 ‘아직은-아님’이듯 언제나 또한 이미 종말이다. 비존재非存在, 다시 말해 육신과 정신 그리고 모든 기회의 소멸을 말하는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는 순간 떠맡게 되는 존재의 한 방식이다.
죽음이니 염려, 양심 등과 같은 실존론적 범주들은 인간의 존재 또는 본질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범주들에는 비록 명료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정오다’ 혹은 ‘3분 후면 버스가 올 것이다’고 말하는 그런 시간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시간이 “작용한다.”
이로써 『존재와 시간』의 핵심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존재의 의미는 동시에 시간의 근원적 본질이다. 그리고 실존, 즉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열어 밝혀져(aufgeschlossen) 있는 장소이다. 오직 인간만이 “존재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열어 밝혀져 있음(Aufgeschlossenheit)을 가리키기 위해 “밝게 틔워 있음(Gelichtetheit)”, “밝게 트임(Lichtung)” 또는 “비은폐(Unverborgenheit)”란 유명한 표현들을 만들어 낸다.]
하이데거는 아직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1927년 『존재와 시간』을 출간한다. 그렇지만 미뤄둔 책의 2부는 끝내 출간되지 않는다. 1930년 이후 철학자의 사유는 일종의 “전회(轉回, Kehre)”를 겪기 때문이다. 그후,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하이데거 사유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와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다.
하이데거는 Gebirge(산맥)이란 말에서 차용하여 “Ge-Stell”이란 용어를 만든다[Ge란 접두어는 ‘모으다, 모이다(versammeln)’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산맥(Gebirge)은 산들(Bergen)이 모인 것이다. ‘Stell’은 ‘세우다, 놓다’를 의미하는 ‘stellen’에서 파생된 것이다].
흔히 ‘몰아세움’으로 “Ge-Stell”은 하이데거에게 “기술技術의 본질”을 의미한다. ‘몰아세움’의 번성함이란 인간 자신이 장악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인간이 부품들처럼 배치되고 사용되고 요구되고 있는 형세를 가리킨다. [‘육교의 진화(Revolution des Viaductes)란 파울 클레(Paul Klee)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기술의 본질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이러한 힘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인간은 세계를 단지 기술적技術的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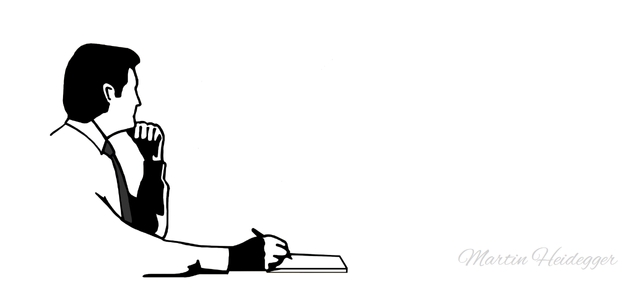
한편 하이데거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인식에 이른다.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 과학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의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학의 차원에 의존한다. 하이데거는 한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물리학은 공간과 시간, 운동 안에서 움직인다. 과학으로서의 물리학은 운동이 무엇이고 공간이 무엇이며 시간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다. 과학은 사유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사유할 수 없다.
예컨대 나는 물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물리학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오직 철학적 물음의 방식으로 물리학이 무엇인지 사유할 수 있다.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는 결코 비난이 아니라 과학의 내적 구조를 규정하는 말일 따름이다.”
(리하르트 비서(Richard Wisser),
『하이데거와의 대화(Martin Heidegger im Gespräch)』)
1928년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하이데거는 모교母校인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는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스승인 에드문트 후설이 가지고 있던 정교수직을 승계한다.
마르틴 하이데거에게도 또한 독일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이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사랑하는 시인 횔덜린과 똑같이 독일 민족에게는 마치 고대 희랍민족의 경우와 유사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믿는다. 독일의 영도領導 아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일 철학의 지도指導 아래 유럽의 정신적 쇄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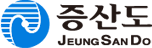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